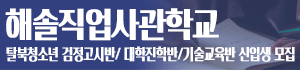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그는 려성위 송인과 우의정 윤은보와 리조판서 소세양에게 도움을 청하는 고목을 띄웠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회답도 없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매질군도 함흥차사였다. 오늘 아침에 다시 편지를 띄웠으나 그것이 제대로 가닿아서 효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줄잡아 열흘은 걸릴 것이니 근 보름 동안 포교들의 손에 시달리우며 다 죽은 송장이 된 괴똥이가 또다시 열흘 동안이면 열 번은 더 거적에 말려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괴똥이의 명은 경각에 이르렀는데 팔이 짧아 진이 혼자로서는 산을 부둥켜안을 수 없으니 누구의 조력을 받아야 괴똥이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런 때 그이가 옆에 있었으면…) 안타까울수록 머릿속에 떠올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놈이의 얼굴이였다. 놈이라면 이런 때 무슨 방도든 해결책을 찾았지 진이, 자기처럼 속수무책으로 뜸단지를 붙인 년모양 아랫목에 앉아서 닭알가리만 쌓았다. 무너뜨렸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채에 다급한 정형을 알려서 대책을 의논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유일하게 줄을 쥐고 있는 괴똥이가 변을 당한 당자여서 아무리 산채가 코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발이 닿지 않는 아득한 만리 밖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였다. 한편 진이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도 은근히 놈이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쓰게 될가 봐 근심스럽기도 했다. 그는 에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는 비록 한생을 어지러운 진창 속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휘지 않은 곧은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였다. 글을 읽어 고사를 안다는 선비들은 인이요, 의요 하면서 고사의 주인공들을 흉내 내려고 하지만 놈이는 그런 고사를 모르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고사의 주인공들과 꼭 같이 인과 의로 빚어진 사람이였다. 의리는 바위처럼 무겁고 죽음은 깃털과 같이 가볍다고. 만약 놈이가 자기 때문에 괴똥이가 참혹한 화를 입은 줄 알게 되면 당장 산채에서 내려와 무슨 무모한 것을 저지르게 될는지. 그것을 진이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혹시 이 마음속의 우려는 진이 자신이 놈이를 사랑하게 된 지금에 와서 그를 특별히 아끼려는 사랑의 리기심이요, 그 리기심을 감추어 놓은 구실인지도 몰랐다. 구실을 뒤집으면 리기심이 드러난다고들 하지 않는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