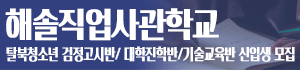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버금가는 두목이 뭐요? 그놈이 그 화적패의 모사랍디다. 놈이란 놈은 우직스러워서 그저 괴똥이란 놈이 부중에 앉아서 줄을 당기는 대루 움직이는 꼭두각시래요.” “그러게 제 버릇 개 못 준다구 안 그럽디까? 그놈이 소시적부터 걸핏하문 칼을 뽑아 들구 광패를 부리더니 잘코사니야, 결국 제 갈 길루 갔지 뭘 그러우.” “이제 상감마누라님께서 전교만 내리시문 곧 효수하리란 말이 있습디다.” 이런 말들은 대체로 포도부장이 포교들과 장교들을 시켜 일부러 내돌린 소문이였으니 자고로 백성들이란 책에 적힌 것이나 관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곧대로 믿는 법이라 떡국이 롱간을 하는 포도부장이 괴똥이를 홈통으로 몰아가는 계교인 줄은 모르고 열심히 그 소문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금이와 진이를 동정해서 측은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놈이 부중에서 제일 이쁜 계집애를 색시루 맞는다구 온통 부러워들 하더니만…그래서 좋은 일엔 마가 든다구들 그러는가 봐. 괴똥이란 놈이야 제한 짓이 있으니 목이 잘려두 응당한 게지만 그 색시는 첫날밤두 못 치르구… 참 불쌍두 하지.” “그 다 이를 말씀이오? 그 색시가 하루 삼시 괴똥이의 옥바라지를 하느라구 군관청을 오가는데 차마 애처로와서 못 보겠습디다.” “색시는 서방이 당하는 횡액이니 할 수 없다 치구 명월이는 얼마나 심정이 딱하겠소? 원, 삼경에 만난 액이라더니 하필이문 잔치날에 그런 봉변을…” “명월이네 집이 아주 란가가 되었겠군.” 혼례식장이 그대로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진이의 집은 사람들의 짐작처럼 란가가 된 것이 아니라 떠나간 집처럼 조용한 집이 되어버렸다. 우선 그처럼 사람으로 붐비던 대문 앞이 랭락해졌다. 나무가 흔들리면 새들이 날아나게 마련이라 진이의 집을 풀방구리에 쥐 나들듯 하던 동네 녀편네들까지 발길을 뚝 끊어버렸으니 진이의 사랑을 바라고 문턱을 넘어 다니던 오입쟁이들은 더 말할 거리가 없었다. 어쩌다 왕래 잦던 사람이 이금이나 할멈을 밖에서 만나면 까닭없이 기겁을 해서 골목 안으로 피해버리거나 제 집 대문 안으로 숨어버렸다. 아침에는 아저씨, 아재비요 저녁에는 쇠아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서글픈 인정세태를 두고 하는 소리일 것이다. 집 안도 역시 랭락했다. 할멈이 그처럼 마음을 조이며 걱정하던 이금이는 괴똥이가 화적으로 몰려 포교들 손에 때여갔다는 것이 적실해지자 신방에 들어앉아 한낮을 소리 없이 울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 나서 이를 옥물고 옥바라지에 나섰다. 옥바라지라고 군관청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는 남편을 얼굴은 보지 못한채 지공하는 것인데 장교들이 군말 않고 음식 그릇을 받아들이니 아직 괴똥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였다. 도리여 평소에는 드살스럽던 할멈이 유약해져서 땅이 꺼지는 한숨을 몰아쉬며 때없이 눈물을 찔끔거렸다. 기거동작이 허둥지둥할 때가 많았고 움직이다가는 목적을 잊고 우두커니 서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벼락이람” 하는 한탄 소리를 쉴새없이 중얼거렸다. 일생을 거친 풍파를 헤치며 살아온 다기진 녀인이였지만 종시 나이는 어쩔수 없어 그로서는 이 ‘마른벼락’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이였다. 진이는 말이 없었다. 돌올한 눈의 정채와 두 뺨의 웃는 빛이 사라졌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