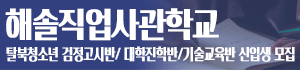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그 후의 이야기
황진이가 촉혼의 분노와 한을 품고 송도를 떠난 경자년으로부터 6년이 지나 1546년 병오년 가을이였다.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강원도의 창도읍에서는 안교리댁 로마님의 칠순잔치로 읍내 일경이 들썩했다. 실은 장치도 장치지만 그보다도 효자로 자처하는 안교리가 어머니의 칠순장치를 맞아 서울에서 데려온 당대 명창 박준의 소리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사람들을 들뜨게 만든 것이였다. 창도읍 같은 산골사람들이 당대 명창의 소리 한마당을 들어본다는 것은 평생에 차례지기 힘든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숭어가 뛰면 망둥어가 뛰고, 남이 장에 간다고 하면 거름 진 놈도 덩달아 따라 나서는 것이 시골사람들의 세태라 소리마당이라고는 호미씻이날 상소리로 엮어진 단가밖에 불러 보지 못한 농군들까지 명창의 소리를 듣는다고 들썽거려서 그날은 아침부터 안교리댁 주변에 장시가 선 것 처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대문 밖까지 행여나 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거미알끼듯 했은즉 행랑채 앞마당이 자가사리 끓듯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는 일이요. 안중 문안 너르디너른 안마당은 멍석을 련이어 깔아놓은 자리 우에 수백 명이 송곳 하나 꽃을 틈 없이 빼곡이 들어차 앉았다. 강원도에서는 엄지가락으로 꼽히우는 안교리댁이라 집 건물도 서울 돌구멍안만 못지않게 근검해서 륙간대청이 어느 큰 고을의 동헌 마루만큼이나 높다란데 그 대청의 북창 밑에는 삼백열두 돌림 통량갓에 옥색도포를 떨쳐입은 량반님들이 죽 늘어앉았으니 거드름스러운 안교리가 주인석을 차지했고 그 옆으로 오른쪽은 이 고을 군수요 왼쪽에 앉은 제비수염의 량반은 안교리의 친구인 서울 손님이요 그 외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고을에서 곤대짓을 하고 사는 량반들이 아니면 안교리의 일가친척들이였다. 안방, 건너방 미닫이들이 다 활짝 열렸고 열린 문마다 발을 드리웠으니 묻지 않아도 그 방들에는 이 잔치의 주인공인 로마님과 내외하는 이 댁 안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 분명했다. 아직 소리광대와 고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북창 아래 앉은 량반들이 한담들을 나누고 있었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