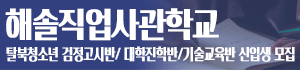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그리고는 마치 끝내지 못한 노래를 마저 이어가듯 호곡을 터뜨렸다. 그 호곡이 오히려 노래보다 더 애절하고 애통스러웠다. 그는 어깨를 떨었다. 할멈과 이금이가 진이를 붙잡아 일으켰다. 진이는 놈이의 몸 대신 그의 온몸을 무겁게 지지누르고 있는 칼을 두 팔로 그러안았다. 눈물을 삼키며 흐느끼며 놈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놈이는 밝게 웃고 있었다. 잠시 마음속의 평온을 깨뜨렸던 격랑은 지나갔다. 도대체 증오와 살기와 악의 이외에는 그 어떤 표정도 담을 수 없게 생겨먹은 그의 갈고리눈에서 어쩌면 저리도 맑은 하늘에 비낀 려명과 같이 순결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웃음이 피여날 수 있을가. 그러나 아무리 밝고 깨끗하다고 해도 그 웃음에는 흔히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쓸쓸한 영별의 빛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비껴 있었다. “아씨, 고맙습니다…저에게는 유한이 없습니다…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씨가 저에게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연이 짧다구요? 분하구 아쉽죠. 하지만 꼭지가 무른 감이 가지에서 멀어지는 것이야 정한 리치가 아닌가요? 자신이 마구 되어먹은 탓이든 이 세상이 못돼먹은 탓이든 아씨와 저는 요행 사랑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는 있으되 그 이상은 어울릴 수 없는 짝입니다. 자기한테 차례지는 분복의 알맞춤한 정도를 스스루 알구 만족할 줄 알아얍죠. 사랑의 합환과 고별의 슬픔이 함께 담긴 잔이라...정말 좋은 말씀이올시다.” 놈이는 진이가 따라준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단숨에 들이키고는 잔을 돌려주었다. “자, 이제는 어서 돌아가십시오...아씨,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래일 효수장에는 절대루 나오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놈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어제와 오늘과 래일이 없고 우와 아래와 옆이 없는 선정삼매의 평온한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는 이미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무한량, 무한대의 고요일 뿐이였다. 진이는 간에서 나왔다. 그는 죽음을 앞둔 놈이의 침착한 태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제 날이 밝으면 참형을 당할 놈이의 얼굴에 깃든 그 평온과 그 고요의 뜻을 리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