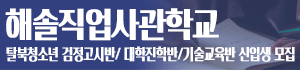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그런데 분명 어떤 때는 단 한 발자국, 꼭 한 발자국이 모자라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그년의 사랑이 자기의 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순간들을 놓고 아쉬워하는 것은 죽은 뒤의 청심환과 같이 부질없는 짓이요. 괴똥이가 물고를 당한 뒤에 명월이와의 사랑을 운운한다는 것은 물에 비낀 달을 그물로 건지려는 것과 같은 허황한 짓이였다. (그렇다면 그 망한 년을 이대루 그냥 곱게 단념해버려?) 아니, 단념해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집어 내던진 잠뱅이 같은 것이냐. 사랑을 않겠다면 완력으로, 완력이 통하지 않으면 권세로, 하여튼지 간에 무엇으로든 진이를 꺾어버려야지 그대로는 짓밟힌 자존심의 아픔과 손상된 긍지의 괴로움을 좀처럼 잠재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가만...이제라두 류수사또의 분부루 수청기생을 만들어 버릴가?) 그러나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아무리 생살권을 틀어쥔 류수사또라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다. 마치 아무리 굶어도 개먹던 찌꺼기는 안 먹는다는 듯 거룩한 사자 시늉을 내던 자기가 갑자기 탐욕스러운 이리나 늑대 노릇을 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그년이 지금처럼 앵돌아진 상태에서 수청을 들라는 사또의 령을 공손히 받아들일는지. 그것도 자신이 없었다. 이제 와서는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촉기 빠른 진이한테 일부러 의혹의 그림자를 던져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깨고소해하여 금신사로 도피행을 한 것도 경솔한짓이였고 돌아온 다음에는 진이가 그토록 안타깝게 자기를 만나려고 애썼건만 그 안타까와하는 모양을 재미있게 내다보며 만나주지 않은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가 낮은 장기군의 말 쓰기였다. (능한 도적은 집의 불부터 꺼준다는데 이건 꼭 시앗싸움을 하는 계집년처럼 패뜩거렸으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싯거리는 동안에 잠기가 싹 달아나버렸다. 어린 관비년이라도 깨워서 다리를 주물리울가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콩콩 하는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