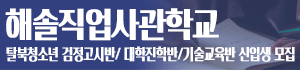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이제 저 소리는 조용히 동쪽채의 끝머리에 있는 이금이의 방으로 사라지리라.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가 련못가를 곧추 지나 진이의 방 쪽으로 가까워졌다. 진이는 바짝 긴장해졌다. 대돌을 짚고 툇마루에 올라서는 이금이의 인기척이 들렸다. 그 인기척에는 평소와 다른 창황한 거동이 느껴졌다. 드디여 방문이 열리며 고개를 푹 떨군 이금이가 힘없이 방안에 들어섰다. 진이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가슴이 미여지는 듯 아팠다. 단 보름 사이에 사람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다. 찌프린 듯 만 듯 반달처럼 휘우듬한 눈썹에 웃는 듯 마는 듯 정겹던 한 쌍의 눈은 어디로 갔는가. 봄날같이 맑은 미소를 머금어 늘 밝고 명랑하던 예쁜 얼굴은 어디로 갔으며 빨갛게 익은 능금이나 금시 피여 오르려는 장미꽃처럼 생기에 넘쳐 반짝이던 아름다움과 젊음의 탈력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보름 동안에 바짝 여위어 뼈만 남은 이금이의 얼굴은 살가죽이 누렇게 뜬 늙은이의 모습이였다. 그는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 같았다. 고개를 들고 진이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 눈동자만이 그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뿐이였다. 그의 모습에는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장이 나버린 인생의 망연자실함이 서려 있었고 마치 이미 인생의 길을 다 지나와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사람의 자포자기와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자신의 림종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는 법이다. 진이는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 이금이를 붙안았다. 붙안고는 그의 몸을 흔들며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생겼니?” 그제야 이금이는 무너지듯 진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해도 여름철의 마른번개처럼 눈물이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이였다. “아씨, 이제는 그이가 더는 못 견딜 것 같다구 그래요.” “못 견디다니…누가 그러디?” “구메밥을 받아주는 장교의 말이 오늘은 압슬형으로 무릎뼈가 다 바사졌대요. 간 안에 끌어다놓았는데 아직두 정신을 못 차린다는군요.” “……” 진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