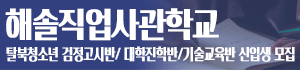이날에 우리 선조들은 무르익은 햇곡식의 가을걷이를 앞두고 풍년을 즐기고, 지방에 따라서는 길쌈을 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인지 추석에 가장 많은 덕담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이다. 이는 풍요로운 마음과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일컫는 조상들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의 표현이었다. 김일성 김정일이 존재하던 1990년 초까지 북한은 조상들의 성묘에 대해 많이 통제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가정의 모든 불행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이 조상을 잘 기리는 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신과 종교를 금하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추석을 말살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990년 초까지 조상님의 성묘 통제 그렇게 되면 당과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 저락이 골칫거리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놓은 결정이 민속명절인 추석을 휴일로 규정하되 성묘보다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다양한 체육경기로 시간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윷놀이와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등의 체육경기와 추석음식 경연대회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선중앙TV에서도 주민들의 성묘활동보다는 다채로운 경기를 추석명절 특집으로 방영하였고, 대중적으로 일반화 하도록 했다. 1970년대에는 성묘행위가 잦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봉건잔재로 치부하면서 고향에서 멀리 추방 보내 귀성길을 봉쇄했다. 하지만 조총련에서 고향의 조상을 기리는 방문단 행렬이 많아지자 그들을 위한 추석 성묘를 일부 허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폐쇄해버렸다. 1980년대에는 ‘새땅찾기’ 명분을 내세워 상당수의 묘지를 경작지로 개간했으며 국도 옆 산의 모든 묘소의 봉분을 평지로 만들데 대한 정형이 하달되기도 했다. 이런 추석의 풍경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라고 할 수 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김일성의 사망은 김정일로 하여금 큰 충격이었고, 그렇다고 일반주민들처럼 자기도 부친의 성묘와 참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조상들에 대한 성묘가 대중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신격화 하여 북한주민들 모두를 참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추석 성묘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조선중앙TV에서도 추석 차례 상이 홍보되었고, 자전거 대열을 지어 산을 찾는 주민들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았다. 고향이 멀어도 휴가를 얻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귀향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기간에는 3일간 통행증이 없어도 다닐 수 있게 했다. 꽃제비들 잘 사는 집 묘 깨끗하게 벌초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유류 난으로 인해 교통사정이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고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추석에 귀향 객이 없자 명절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다.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한 ‘민족 대이동’은 찾아볼 수 없고, 일부 특권층만이 성묘를 위해 이동할 뿐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조상의 묘를 보고 부자와 가난뱅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묘의 비석과 상석을 비싼 대리석으로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나무나 돌을 엮어 만들어 놓는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꽃제비들은 추석이 되면 아침 일찍 밥한 술 얻어먹기 위해 산에 먼저 올라가 잘 사는 집으로 보이는 대리석의 상석과 비석으로 된 묘의 벌초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에게 호감을 얻어 여러 가지 음식을 조달받는 이른바 ‘대리 관리제도’가 생겨나기도 했다. 북한의 성묘일상을 보면 우선 묘의 벌초를 먼저 한 다음 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에게 조상의 묘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술을 붙는다. 이는 앞으로도 조상을 잘 받들어 달라는 의미와 함께 가족의 평안을 기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함께 모인 가족과 친인척끼리 상석에 종이를 펴고 차례 상을 차린다. 차례 상 음식으로는 전, 명태, 과일, 그리고 술과 고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시에 담는 음식이 모두 홀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의 절이 이어진다. 집에서 차례 지내지 않고 바로 성묘 북한에서의 남한과 차이점은 아무 날이나 가고 싶을 때 묘지를 찾는 남한과는 달리 1년에 두 번밖에 묘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식(寒食)이나 추석외의 다른 날에 묘지를 찾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추석 성묘 차례 상에서 남은 음식은 절대로 가지고 내려와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상이 노하여 가족 중의 한사람을 데려가거나 가정의 불행이 찾아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추석날 우리는 집에서 차례를 먼저 지내지만 북한에서는 바로 성묘를 간다. 성묘를 통제하던 시기에 절하는 것은 봉건잔재라 하여 금지했기 때문에 묵례만 했다. 성묘 후에는 빈 접시에 술과 밥, 국이나 반찬 등을 조금씩 담아 산소 주변의 땅에 묻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한 탈북자는 “군에 입대한 지 일 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부대가 훈련 중이라 장례식은커녕 산소를 찾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전에 아버님께 효도도 못하고 근심만 끼친 자식이 ‘장례식 후에도 10년간 성묘 한 번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추석이 단순한 민속명절의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것은 열악한 교통사정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교통이 워낙 불편해 멀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가친척이 모여 추석을 보내는 일도 찾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가급적 산소를 먼 곳에 쓰지 않는다. 또한 추석에는 특별 배급조차 없어 가난한 북한의 주민들에게 추석은 평소처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명절일 뿐이다. 곽명일 기자 38tongil@gmail.com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